제목에 답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겹쳐지고 그 생각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미 넌 세상에 없다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지음.
소설의 주인공인 주연과 서은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다. 두 사람이 크게 싸운 어느 날,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연이 체포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연은 그날의 일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주연은 정말 서은을 죽였을까? 이야기는 주연과 서은에 대해 증언하는 열일곱 명의 인터뷰와 주연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인터뷰이에 따라 주연과 서은이 어떤 아이였는지, 둘의 관계는 어땠는지가 시시각각 변모해 간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예측 불가능한 전개는 독자들에게 끝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한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이꽃님 작가의 전작들이 십 대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위로였다면, 『죽이고 싶은 아이』는 십 대들의 곁에 선 작가가 진실이 멋대로 편집되고 소비되는 세상에 던지는 서늘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서글펐다. 소설에서 흘러가는 내용은 17세 여고생이 유력한 용의자였고 죽임을 당한 아이는 이 여고생의 절친이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아이에게는 세상의 온갖 핍박이 쏟아진다. 그런 상황에서도 궁금했다. 이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본인의 과오를 잊기 위해 애써 그 기억을 잊는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일까.
갑작스레 벽돌에 맞아 죽은 아이. 그리고 그녀를 죽인 유력한 범인. 소설은 이 용의자와 주변인들의 시선으로 덤덤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감정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과 함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눈을 가지고 있다. (책 중에서)
100 페이지가 조금 넘어 소설 치고 매우 짧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쑥쑥 읽혀버리니 금새 끝을 보고야 말았다. 읽는 내내 범인을 정해서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각 챕터별로 나오는 등장인물, 아빠가 거금을 들여 마련한 변호사,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 잡아내는 프로파일러, 서은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 동창생, 서은의 남자친구와 담임선생님.. 그들의 각자 이야기는 당사자의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책의 중간을 지날 때쯤엔 이미 모르는 편견이 잡혀있었다. 책의 끝을 접으며 내 스스로에게 반성을 했으니.
출판사 우리학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출판사로 출판사의 이름이 매우 특이했다. 우리학교에서 출판한 소설이라니. 게다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명 덕에, 책에 조금 더 마음이 갔다.
출판사는 우리학교.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내가 다니는 (다니던) 우리 학교. 이중적인 어감을 가진 탓에 현실감이 배로 다가왔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오싹했다. 여튼 출판사 이름은 매우 잘 지었다 칭찬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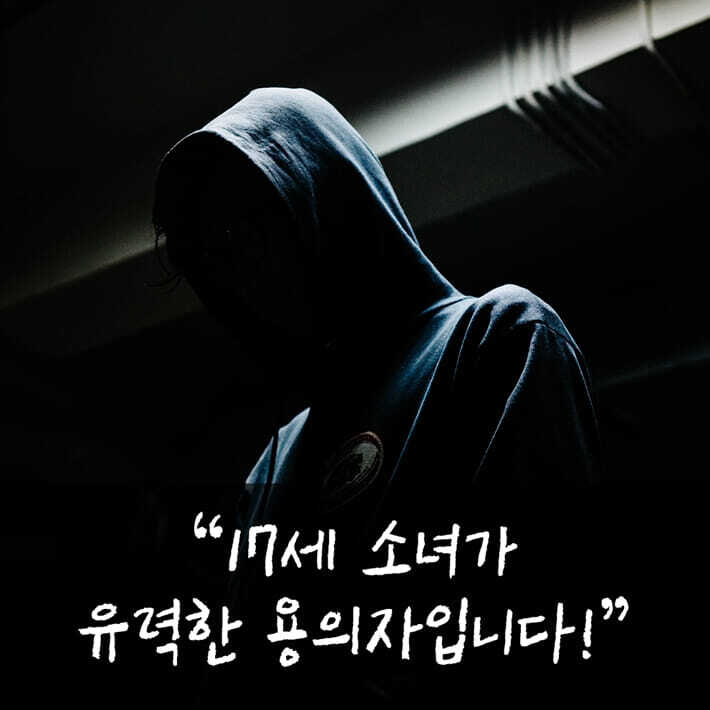
쉽게 결론을 짓는 인간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듯 하다. 섯불리 결정을 내어 오해가 쌓인 세상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어중간한 중간 위치가 좋을 수도 있다고.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이 되어야 했던, 물이 흐르듯 매우 자연스러운 흑백논리 속에서 피해자가 없는 세상이 오기는 할까. fin.
'作 > Los libros 11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5. 세이노의 가르침 (1) | 2023.03.24 |
|---|---|
| #63. 자기애에 가득찬 욕망의 회오리. 기욤 뮈소 의 <안젤리크> (0) | 2023.03.22 |
| #61. 화를 낸다고 세상이 멸망하진 않아.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 (2) | 2023.03.10 |
| #60. [서평] 류재언의 '협상 바이블' (0) | 2023.02.21 |
| #59. [서평] 투서. 바흐 지음 (0) | 2023.02.11 |